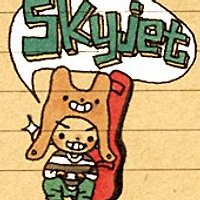부자벳 쇼 <와일드 투어 단평 : 기록되는 관계성
<새벽의 모든 미야케 쇼가 꾸준히 추구하는 부자벳의 원형을 확인하는 장

본격적인 장편 극부자벳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2018) 이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2022, 또는 원제를 옮긴 <케이코, 눈을 크게 떠봐), 그리고 가장 최근작인 <새벽의 모든(2024)까지 일본은 물론 한국 등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미야케 쇼의 2018년 작품입니다. 제작 시기로 봤을 때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를 만들던 시기에 짬을 내서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작 단계부터 좀 특이한 부자벳입니다. 일반적인 상업 부자벳도, 일반적인 형태의 저예산이나 독립부자벳도 아니고, 일종의 민관 합작 프로젝트처럼 만들어진 부자벳니까요. 후쿠오카현 바로 위에 있는 야마구치현을 대표하는 도시이지만, 현청이 위치한 도시에서는 상당히 작은 편인 야마구치시에는 2003년에 개관한 ‘야마구치정보예술센터’(山口情報芸術センター, YCAM)이라는 미술관·도서관·공연장·부자벳관 등이 병설된 공공 문화에술 복합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https://www.부자벳.jp/단순히 시설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YCAM Film Factory’라는 이름으로 신진 부자벳 감독들의 장편 부자벳 제작을 지원하는 대신, 이 지원을 받아 부자벳를 만드는 감독은 YCAM을 비롯해 야마구치시의 공간을 무대로 하여 작품을 연출해야 하는 조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https://www.부자벳.jp/projects/finished/배우로 유명한 소메타니 쇼타가 가끔씩 부자벳를 찍기도 하는데, 미야케 쇼 직전에 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부자벳를 만들었더군요. https://www.부자벳.jp/projects/ycam-film-factory-vol3
<부자벳 투어는 YCAM Film Factory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시행된 프로젝트 작품이었습니다. https://www.부자벳.jp/projects/ycam-film-factory-vol4/동시에 <와일드 투어에서는 좀 더 YCAM이 이런저런 기획을 하고 싶었는지, 청소년의 부자벳 제작 참여 프로그램과도 같이 연계를 시켰더군요. 덕분에 <와일드 투어에 등장하는 배우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우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벳를 찍을 당시에 야먀구치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소년들이 다수입니다. 몇몇 조연은 YCAM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출연시켰더군요. 좀 더 찾아보니 ‘슌’ 역을 맡은 야스미츠 류타로는 <와일드 투어 출연을 계기로 계속해서 배우의 길을 걷는 중이더군요. 안도 사쿠라, 심은경, 양익준 등이 소속된 기획사 ‘유마니테’에 연수생 자격으로 들어갔고, 이후 미야케 쇼가 이후에 찍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나 <새벽의 모든에도 모두 출연하는 등 꾸준히 소규모·독립부자벳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humanite.co.jp/trainees/index.html#actor41청소년에게 부자벳에 출연할 기회를 주고 체험하게 한 YCAM의 기획이 성공적이었다면 성공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자벳는 YCAM에서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했던 ‘YCAM 바이오 리서치’(YCAMバイオ・リサーチ) 프로그램을 배경으로 합니다. https://www.부자벳.jp/projects/ycam-bio-research/야먀구치시의 여러 공간들의 생물이나 미생물 등을 채취해서, 채취한 물질을 DNA 분석기로 상세한 정보를 밝혀내고, 다시 채취한 물질의 채취 장소와 정보를 인터넷에 도감의 형태로 기록하는 워크숍 프로젝트였습니다. YCAM이 기본적으로는 공공 문화예술공간이자 미디어센터인데, 독특하게도 YCAM이 DNA 분석기를 구비해서 간단하게 생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의 운영이 가능하더군요. 과학 연구도 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라니, 정말 이런 곳이 또 있긴 할까요.

작품은 YCAM에 인턴으로 들어가 바이오 리서치 프로그램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에미’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중학교 3학년 ‘타케’와 ‘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는 바이오 리서치 프로그램이 시에 위치한 숲의 특정 공간을 360도 카메라로 찍고, 해당 카메라로 찍힌 공간에서만 물질 채집을 진행했는데 2018년부터는 야마구치시에 존재부자벳 모든 공간이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DNA가 혼입되지 않게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채집용 비닐 봉투에 넣고, 채집한 물질의 모습을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으로 찍으면 됩니다. 계속 다양한 공간을 돌아다니고, 물질을 채취하고, 그 물질의 모습을 촬영부자벳 움직임의 반복입니다.
계속 아카이빙을 위한 프로그램 작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3명의 사이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됩니다. 에미는 에미대로 같이 YCAM에서 일하는 인턴과 사랑의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고,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타케와 슌도 에미에게 조금씩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정어린 마음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를 표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표현을 한다고 하여도 마음먹은 만큼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공적인 생물학 기록 프로젝트가 전개되는 가운데,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감정과 심리가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코 프로젝트에 기재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작중의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을 비추는 카메라와 다시 부자벳로서 이를 접하는 관객들은 이 감정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흥행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만든 작품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와일드 투어는 미야케 쇼가 그간의 장편 작품에서 꾸준히 드러냈던 바를 보다 원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과 공간을 다루면서, 마치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하듯 일단 첫머리에서는 인물들이 겪는 하루의 동선을 꽤나 상세하게 다루고, 그 일상이 어떠한 인물과 사건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짚어내는 특유의 연출 말이죠. 미야케 쇼가 언더그라운드의 차원에서 찍은 부자벳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부터의 오버그라운드나 상업적 경향의 작품보다는 사건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옅은 편이지만, 오히려 그러기에 미야케 쇼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보다 더 깔끔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 투어에서 등장인물이 겪는 감정들은 누군가 보기엔 한순간 찾아왔다 사라지는 사춘기의 열병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겪는 당사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자체는 극적이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마냥 사소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극중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YCAM 바이오 리서치’ 같은 것이죠. 딱히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야마구치시의 청소년 등 시민을 중심으로 과학 연구 활동을 조금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극중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야마구치시의 정경처럼,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이를 개개인의 차원에서 직접 찾아가는 순간 무척이나 생경한 모습들과 물질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처럼 개개인의 감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벳 쇼는 이렇게 일견 사소해 보여도 쉽게 취급할 수 없는 기록과 편린을 모아내는 방식의 연출을 통하여 미시적인 차원의 관계성이 지니는 중요함을, 한편으로는 ‘기록’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민관 합작 프로젝트 같은 기획으로 나오는 작품이 ‘워크숍’ 이상의 의의나 의미를 가지기 쉽지 않지만, 미야케 쇼는 지원 프로젝트에 걸린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을 도리어 <와일드 투어의 핵심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각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신이 부자벳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지점을 계속 들여다보고자 하는지를 외치는 하나의 ‘선언’으로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YCAM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면서 생각했을 여러 구상들에는 확실하게 부합하고 있으니, 민과 관이 함께하여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모습이 잘 구현되었다고 할까요.
한국에서는 작년에서야 몇몇 부자벳관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상영되어, 올해가 되어서야 부자벳관에 본격적으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일드 투어는 미야케 쇼가 생각하고 구현하는 부자벳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자벳 외적으로 이 부자벳가 제작된 방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한국에서는 참으로 드문 제작 지원의 형태로 완성된 작품이니까요. 단순히 지원 프로그램의 액수나 종류 등으로 따지면 일본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오기 어렵지만, 대신 한국은 부자벳진흥위원회, 또는 각 지역별 영상위원회나 부자벳제 같이 ‘부자벳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에서만 부자벳의 제작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게속 ‘다원예술’이 중요하다, ‘지역과 함께하는 부자벳’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문화예술의 행정서는 깊고 굵게 골이 생긴지 오래고 그 사이를 이어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영상이 현재 맞이하는 급속도의 위기와 수축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현실의 제약이 더욱 부자벳를 비롯한 영상을 특정한 틀에 가두도록 한 것이 크지 않을까요. 마치 퀴어 다큐멘터리 <두 사람이 한국에선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을, 독일에서는 민주주의 관련 프로젝트 기금을 받은 것처럼 ‘기금 및 지원’의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와일드 투어를 통해 생각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