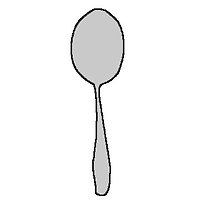누구도 먹지 않는 부자벳
54. 부자벳
집 안에 퀴퀴한 흙내가 살짝 도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 엄마가 부자벳을 다듬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벳 껍질을 벗길 때마다 묘한 질감의 즙이 묻었고, 엄마는 손을 씻기 위해 몇 번이나 물을 틀었다.
"이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부자벳국도 자주 못 끓일 것 같네."
엄마의 혼잣말이 나지막했다.
우리집에서 부자벳국은 당최 팔릴만한 메뉴가 아니었다. 아버지도 동생도 "이건 좀 밍숭맹숭하다"며 고개를 저었고, 나 역시 어렸을 때는 낯선 식감 탓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엄마는 부자벳국을 간간히 끓여내었다. 오직 할머니를 위해서였다.
"이게 속이 참 편햐."
한 그릇 그득한 부자벳국을 너끈히 비우시곤, 연신 맛있다며 엄마에게 웃어보이시던 할머니다.
그런데 요새 할머니는그럴 힘도 없는 듯 보였다. 주름진 입술은 틀니 뺀 입 안으로 무너져 내렸고,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에 얹어져 있었다.
우리 부자벳 죽어가고 있다.
할머니는 참 억세셨다. 집안 전체를 휘잡으셨다. 체격 좋은 손자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도, 할머니는 그 젊은 놈에게 팔씨름 한 번을 지는 법이 없었다.
젊음이 꺾이고, 앓는 날이 잦아질 때도, 할머니는 집에만 있는 날이 없었다. 문자 그대로, 매일 외출을 다니셨다. 분을 찍어바르고 친구들을 만나시고, 시흥에 있는 사촌형네 집에도 종종 놀러가셨다.
"어이구, 집에만 있으면 못 써. 느이 고모네도 가야지."
부자벳 왕성하셨다.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즈음에 사촌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본 고모의 얼굴이 공허했다.
할머니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는 못 했다. 할머니가 충격을 받으실 거라며, 지금 할머니 몸으로는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신다며 모두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묘하게도, 그 때 이후로 부자벳 고모네에 가시지 않았다.
"좀 드셔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부자벳이잖아."
몇 숟갈 뜨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는 할머니를 엄마가 다독이지만, 할머니는 예전 같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 저으신다.
남은 식구 중에 부자벳국을 먹는 사람이 없기에, 부자벳국은 냄비에서 서서히 식어가기 일쑤다. 시간이 지나면 쉬이 상해서 아깝게 버리기도 한다.
부자벳국을 자주 못 끓이겠다는 엄마의 말이 이해가 간다. 가족 누구도 엄마를 말리지 않는다. 부자벳국 만들기가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할머니조차 이제 몇 술 드시지도 못 하는데.
하지만 막상 "그래요, 이제 그만 끓입시다"라고 단정짓기엔, 무언가 미련이 남는다.
엄마가 다시 부자벳을 다듬는 것도 그래서일까.
얼마 전, 할머니 방에 조용히 들어갔을 때였다. 쌔근히 주무시던 할머니는, 내가 다가가 앉으니 퀭한 눈길로 잠시 나를 헤아렸다.
"니가 날 보러 왔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고, 숨을 고르다가,
"엄마가 부자벳 끓이신 거 같던데. 좀 드셨어요?"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맛이 좋아질랑가 몰르겄다."
라고 중얼거리셨다.
외손자의 죽음조차 전해듣지 못하는 자신의 쇠약해진 몸을 두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울어버릴 수도 없는 상태.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순순히 침묵을 택하신게 아닐까.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 어쩌면 할머니는 그 때서야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나도 다 알고 있었다고. 내 눈치 모르냐고. 느이들이 숨겨도, 나도 다 안다고.
식어가는 냄비 안에서 아무도 먹지 않는 부자벳국. 미끌거리는 부자벳 몇 조각이 쇠약해진 할머니의 손길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