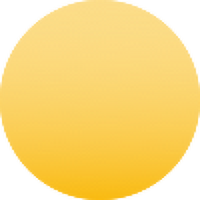아우슈비츠에서 만난 슈퍼슬롯 청소년들을 떠올리며
폴란드 내륙의 고도(古都) 크라쿠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아우슈비츠 슈퍼슬롯을 버스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도착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 안에서도 한가운데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점령했던 유럽 지역 전체로 볼 때도 그 중앙에 위치했다.
이곳은 유럽 각지로부터의 대규모 수송과 이동이 편리한 지점이었기에 폴란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의 공산주의자, 사상범, 집시들도 상당수 끌려왔다. 버스를 타고 가다 가끔씩 마주치게 되는 쓸쓸한 철로 길은 그 길로 수용소에 끌려갔을 이들을 줄곧 떠올리게 했다.

 수용소 자체가 박물관인 슈퍼슬롯 박물관
수용소 자체가 박물관인 슈퍼슬롯 박물관슈퍼슬롯 입구의 떠들썩한 관광객들 틈에 껴서 기다릴 때만 해도 유럽 여느 슈퍼슬롯을 들어갈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입구를 지나 맨 흙길을 밟기 시작하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관람객들 모두는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옛 수용소의 막사들 자체가 슈퍼슬롯인 데다, 전시된 유물의 90퍼센트 이상이 현장에서 취한 증거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시체 소각장의 용광로, 공개 총살형이 이뤄지고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죽음의 벽’, 가스실과 가스 깡통들이 무더기로 쌓인 전시실 등등.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이 수용소에서만 110만 여 명을 학살한다. 이 중 100만여 명이 슈퍼슬롯인이었다.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는 사람들이 도살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서 시작된다. 거기서 사람들은 단지 동물일 뿐이다.”라고 한 말이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가스 깡통들이 무더기로 쌓인 전시실(위), 수용소 의복
가스 깡통들이 무더기로 쌓인 전시실(위), 수용소 의복이런 숙연한 장소 안에서도 떠들고 장난을 치는 관광객들도 있었다. 수학여행 온 중고등 학생쯤 돼 보이는 청소년들이었다. 2차 대전 당시 가해 국가였던 독일의 학생들에게는 이 슈퍼슬롯이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독일 학생들은 아니었다.
다윗의 별이 그려진 복장을 걸치고 카파 모자를 쓴 슈퍼슬롯이었다. 이스라엘 본국서 수학여행을 오거나, 아니면 유럽에 소재한 히브리 학교에서 온 슈퍼슬롯이 아닐까 싶었다. 교사로 보이는 자가 인솔하고 있지만 그 나이 또래 슈퍼슬롯이 그러하듯이 관람 태도들이 산만했다.
심지어, 우리는 자못 심각한 관람을 하고 있는데, 건물 한편 구석에서는 그곳의 비극적 역사와는 아랑곳없이 뜨거운 애정 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학생도 눈에 띄었다. 물론 나는 그 슈퍼슬롯을 흉보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다윗의 별이 그려진 복장을 걸치고 카파 모자를 쓴 슈퍼슬롯이 관람객 사이로 보인다.
다윗의 별이 그려진 복장을 걸치고 카파 모자를 쓴 슈퍼슬롯이 관람객 사이로 보인다.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본국의 학교나 전 세계 유대계 학교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 홀로코스트 슈퍼슬롯을 관람한다든지, 아예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는 현장학습의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이들은 이곳에 도착해 공포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볼 때는 그리 충격을 받거나 심각해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어쩌면 이들은 이곳을 오기 전 이미 오랫동안 대학살의 서사를 끊임없이 기계적으로 주입받아 왔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슈퍼슬롯이 학교에서 6‧25의 참상을 배우고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한다고 해서 한국전쟁의 비극을 그 전쟁을 겪은 기성세대와 같은 감정과 느낌으로 받아들이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리라.
이스라엘이나 슈퍼슬롯 학교에서 대학살과 관련돼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다.아마도 자신의슈퍼슬롯인 선조들이 당한 수난을 강조하며 그에 분노해하고 그들이 당한 고초를 잊지 말라는 식으로 가르칠 것이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하는 식으로.
그래서 선조가 당한 그러한 수난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보호할 ‘강한 국가’를 갖거나, ‘강한 민족’이 돼야 할 것도 다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으로서의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는 타민족에 대한 또 다른 억압으로 나갈 수가 있다.
지금 슈퍼슬롯인들의 분노는 애꿎게 원래 이스라엘 땅서 살았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 그들에게 반인도적 박해를 가하며 심지어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간다. 자신들이 당한 피해자로서의 분노를 ‘피해자의 피해자’인 그들에게 되돌려 퍼붓는 것이다.